얼마 전 누가 갑자기 웹 디자인에 대한 내 생각을 물어본 적이 있다. 그 순간 머릿속 이 생각 저 생각이 한꺼번에 뒤섞이고 순서 없이 내뱉어지면서, 전달이 제대로 안 되었던 아쉬운 경험이 있다. 그래서, 다시 한 번 그동안 여러 사람의 얘기와 글을 통해서 동감했던 내 생각을 정리해 본다.
웹 디자인을 얘기할 땐, 가장 먼저 웹의 태생과 디지털 웹 미디어의 소비 패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. 웹이 탄생하게 된 이유는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손쉽게 정보를 소통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태어났다. 이것은 결국, 정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사이트라면 그때나 지금이나 원래 목적이 이미 실패한 거나 다름없다는 얘기다.
현 상황을 살펴보면, 수많은 종류의 웹 클라이언트(웹 브라우저)들과 언제 어디서든 웹에 접속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장비들이 존재하고 있다. 그래서, 이런 특이한 상황마다 적절한 대처를 고려한 UI 디자인이라면 처음 시작 단계부터 웹 페이지에 담긴 정보를 충실하게 골고루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.
또한, 웹 디자인은 과거 웹의 탄생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출판 인쇄물 디자인과 약간 다른 성격을 띠는데, 이 점을 간과하면 큰 실수를 범하기 쉽다. 물론 공통으로 닮은 점도 있다. 예를 들어, 독자가 책을 선택하고 읽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그 책에 담긴 내용을 흡수하려는 목적이 제일 클 것이다. 물론 읽기 편하게 배치된 문단과 고운 활자 디자인은 독자들로 하여금 정보를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만 말이다. 이처럼, 디자인의 핵심은 바로 원활한 내용 전달에 있다.
여기서 웹만이 지닌 차이점이라면,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들에 내장된 클라이언트들은 각자의 다른 정보 해석 방식과 표시 유형이 서로 달라서, 그만큼 개발자가 손보고 신경 쓸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. 더군다나 웹은 사용자들과의 상호작용도 더 동적이지 않은가?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, UI 개발자들의 세심함과 배려 그리고 창의성을 잃지 않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고, 또 이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생각되는 이유이다. 덩달아, 가까운 미래의 웹은 과거와 달리 HTML5를 비롯한 흥미진진한 웹 표준 기술들의 등장과 확산으로, 그 어느 때보다 개발자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훌륭한 밑바탕이 마련되고 있다.
난 잘 만들어진 웹 디자인을 우리나라 한옥에 비유하고 싶다. 한옥은 사람들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주위의 환경과 조화를 이뤄, 바깥 드넓은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단단한 구조물이다. 이처럼, 좋은 웹 디자인도 단지 겉으로만 보이는 두꺼운 포장이 아닌, 정보 소통을 원활하게 연결해주는 하나의 잘 짜인 틀이라 생각한다.
맺는 말로, 전에도 인용했던 Jeffrey Zeldman씨의 좋은 웹 디자인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.
Good design is invisible.
Good web design is about the character of the content, not the character of the designer.
그래서, 티 나지 않게 다가가 자연스레 스며드는 디자인이 멋진 디자인이다.
 이런 상황에서 훌륭한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수퍼스타 CSS3이다.
이런 상황에서 훌륭한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수퍼스타 CSS3이다.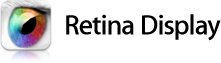 그래서, 앞으로 점점 늘어날 이런 고해상도 display를 염두해 둔 이미지를 준비해놓지 않는다면 정교한 화면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.
그래서, 앞으로 점점 늘어날 이런 고해상도 display를 염두해 둔 이미지를 준비해놓지 않는다면 정교한 화면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.